매생이국
매생이국 몇 끼 먹었다.
얼린 한 덩어리에 4불, 상품은 아니겠지만 그만하면 됐다.
굴 한 봉지, 그게 서해에서 채취한 자연산 같지 않아 크고 흐느적거리는 거지만 것도 됐고.
좋아하는 줄 아니까 아내가 큰맘 쓴 거네.
그렇게 사흘쯤 즐거웠다.
달지 않아도 달콤한 것 있지?
{사실 단 건 달곰하지 않더라고.}
감칠맛이 있게 꽤 단 걸 두고 달콤하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마음이 끌리게 아기자기하고 기분이 좋은, 그러니까 “달콤한 그대 목소리” 같은, 또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 “그대의 품에서 달콤한 쉼을 얻었다오”처럼
아 그러니 달콤한 게 좋은 거네?
매생이? 달콤해.
그래도 “매생이 같은 여자”? 그렇게 불러줬다고 좋아하진 않을 것 같네.
{“칭찬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시무룩.}
“매생이국을 잘 끓이는 여자” 그러면 “음식솜씨 좋다는 얘긴가” 하고 안심한 표정?
肉感的이라고 다 十九禁이겠는가?
“맞아!” 그러며 침 넘어가는, 전혀 외설스럽지 않은
정일근의 ‘매생이’
다시 장가든다면 목포와 해남 사이쯤
매생이국 끓일 줄 아는 어머니를 둔
매생이처럼 달고 향기로운 여자와 살고 싶다.
뻘바다에서 매생이 따는 한겨울이 오면
장모의 백년손님으로 당당하게 찾아가
아침저녁 밥상에 오르는 매생이국을 먹으며
눈 나리는 겨울밤 뜨끈뜨끈하게 보내고 싶다.
파래 위에 김 잡히고 김 위에 매생이 잡히니
매생이를 먹고 자란 나의 아내는
명주실처럼 부드러운 여자일거니, 우리는
명주실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해로할 것이다.
남쪽에서 매생이국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
차가운 표정 속에 감추어진 뜨거운 진실과
그 진실 훌훌 소리 내어 마시다 보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뜨거워지는 것을.
아, 나의 아내도 그러할 것이다
뜨거워지면 엉켜 떨어지지 않는 매생이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사랑할 것이다.
또, 안도현의 ‘매생이국’
저 남도의 해안에서 왔다는
맑은 국물도 아니고 건더기도 아닌 푸른 것,
다만 푸르기만 한 것
바다의 자궁이 오글오글 새끼들을 낳을 때
터뜨린 양수라고 해야 하나?
숙취의 입술에 닿은 이 끈적이는 서러움의
정체를 바다의 키스라고 해야 하나?
뜨거운 눈물이라고 해야 하나?
입에서 오장육부까지 이어지는 푸른 물줄기의 폭포여
아무리 생각해도, 아 나는 사랑의 수심을 몰랐어라.
매생이 없을 때도 있었고, 모를 때도 있었지만
알고 나면 없이 못 살 것 같고, 두고두고 그리운 것.

봄은 봄(seeing)이고 옴(coming)인데
보긴 봤지, 꽃 폈으니까
오긴 왔지, 옷차림들 달라졌으니.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게는 봄 아니네.
그래도 냉이국, 달래찌개, 쑥범벅 먹고 싶은 걸 보니 봄은 봄인개벼?
나생이라고 해야 더 맛있는 것처럼 들리는 냉이, 해서 김선우가 그랬지.
나생이는 냉이의 내 고향 사투리
울 엄마도 할머니도 순이도 나도
나생이꽃 피어 쇠기 전에
철따라 다른 풀잎 보내주시는 들녘에
늦지 않게 나가보려고 조바심 낸 적이 있다
아지랑이 피는 구릉에 앉아 따스한 소피를 본 적이 있다
울 엄마도 할머니도 순이도 나도
그 자그많고 매촘하니 싸아한 것을 나생이라 불렀는데
그 때의 그 ‘나새이’는 도대체 적어볼 수가 없다
흙살 속에 오롯하니 흰 뿌리 드리우듯
아래로 스며드는 발음인 ‘나’를
다치지 않게 살짝만 당겨 올리면서
햇살을 조물락거리듯
공기 속에 알주머니를 달아주듯
‘이’를 궁글려 ‘새’를 건너가게 하는
그 ‘나새이’,
허공에 난 새들의 길목
울 엄마와 할머니와 순이와 내가
봄 들녘에 쪼그려앉아 두 귀를 모으고 듣던
그 자그마하니 수런수런 깃 치는 연둣빛 소리를
그 짜릿한 요기(尿氣)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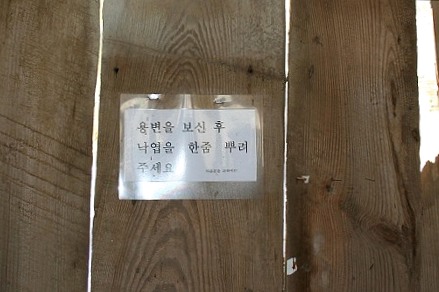
봄나물보다 그리운 건 남도의 바다풀들인데
그건 이제 제철 지나고 있겠네?
사촌 아니면 육촌쯤은 되는(영어로는 다 cousin) 파래, 감태, 매생이, 그리고 피난시절 먹던 싱기(싱경이)
톳, 꼬시래기, 모자반-제주도에서는 참모자반을 ‘몸’이라 해서. 으 그 ‘몸국’도 좋더라-
아 그런 것들도 먹고 싶다.
매생이국 한번 먹고 재는 꼴이라니...
어릴 적에 누룽지 들고 나와 대문밖에 서서 아작아작 깨어먹으며 애들 속상하게 만들던 심보로?
{부잣집 애들은 픽픽거리겠네.}
그냥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불러 젖히고 싶은 오후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