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1
밥 안 먹고는 살지 못하는 주제에 밥을 우습게 여기는 건 뭐야?
“내가 니 밥이야?” “이게 누굴 밥으로 알아?” 다들 밥이 안 되려고 한다.
“나는 밥이다” 그런 성현도 계신데.
그리고 “겨우 밥이나 먹고 삽니다”라는 말도 참 그러네.
아 밥 먹으면 된 거지. 밥 먹어 살면 된 거지.

난 밥이 좋다. 좋으니 맘껏 먹는다.
조금 모자란다 싶을 때 그만 둬야 하는데
탱탱한 배 두드릴 때 나는 통통 소리에 “또 너무 많이 먹었구나” 후회하지만...
그게 悔만 하지 改는 따르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내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많이 먹을 게 확실해.
19세기 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한 선교사는 우리네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어머니는 무릎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밥이나 다른 음식을 마구 먹이고는
배가 넉넉히 팽팽한가 보기 위하여 숟가락으로 배를 두드려보더라.”
선교사는 그 모습을 보며 “에잇 미개한 것들” 그런 모양인데
넉넉하다는 것, 채워졌다는 것, 충만한 것, 그게 ‘shalom’의 본뜻인데, 뭘 모르는개벼.
장자는 다스림의 최고 상태로 ‘含哺鼓腹(함포고복)’을 들었다.
어린아이는 젖을 물고 기뻐하고 어른들은 배불리 먹어 배를 두드리며 즐기는 상태,
그러면 “어화 태평성대로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지 않겠나.

삼식이XX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난 즐겨 나가 먹는다.
아 다들 어렵던 시절에 누룽지 들고 나와 애들 보는 앞에서 먹던 못된 놈도 있었지?
비싼 데 가서 별난 것 먹었다고 좋은 데 소개하듯 꼬박꼬박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더구먼.
우리야 뭐 ‘5k or less’로 못 박았으니까.
어느 날 “오늘은 쌈밥집에 갈까?” 했더니 ‘싼 밥집’으로 알아들은 거다.
“싼 밥집 안 다닌 것처럼 새삼스럽게?” 그러는 것이었다.
{으그, 쥐구멍...}
“맛있게 먹으면 됐지 비싼 거라야 맛인가”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대부분 같이 나가기는 하지만
혼자 나갔다고 하더라도 보통 친구와 같이 먹게 되지만
어떤 때는 혼자 먹어보고도 싶더라고.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
몸에 한세상 떠 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은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 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황지우, ‘거룩한 식사’-
혼자 먹는 이들 틈에 간첩처럼 잠입하여
“저도 같은 ‘꽈’입니다만...” 청승떨고 싶더라니까.

국밥, 국밥집, 국밥집 여자, 얼마나 정겨운 말인가?
가만, 여자? {피식} 뭔 여자?
옹기 깨지는 소리 빽빽 질러대지 않나
하루에 간보기를 몇 번이나 할까, 게다가 손은 늘 젖어있으니
몸매, 손, 에이 그런 거야 볼 거 없지.
{더러 직접민주주의 개별 몸짓으로 출렁이기도 하더라마는.}
암튼, 어릴 때 챙겨주지 못한 누이나 잘 자라준 조카 한번 안아주고 싶은 마음처럼
괜히 안쓰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뭐 그런.
대개 옌뻰아줌마들이겠지, ‘친절’ 소양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탓할 것도 없네.
국수 말아주는 할머니가 국물 좀 더 달라는 사람에게 “누군 맹물 퍼서 장사하나?” 그러더니
미안했나, 자글자글 주름진 입으로 수줍게 웃고는 양푼 채우듯 부어주대.

그깟 모자반이 뭐 대단하다고 두고두고 생각날 건 아닌데...
몸국이라는 이름 때문, 몸-국이라...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국수가 먹고 싶다’-

국수는 밥이 아니지만 끼니이기는 한데
국수도 국수 나름이라 꼭 밥보다 헐하다는 법도 없고
그리고 잔치국수니, “국수 언제 먹냐?”는 둥 흥겨운 공동체의 모꼬지用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좀 슬프기도 한 거라.
그게 울음 터지는 슬픔은 아니고, 좀 경건해지게 하는 마력도 있어서...
하루 일 끝마치고
황혼 속에 마주 앉은 일일 노동자
그대 앞에 막 나온 국수 한 사발
그 김 모락모락 말아 올릴 때
남도 해 지는 마을
저녁연기 하늘에 드높이 올리듯
두 손으로 국수사발 들어 올릴 때
무량하여라
청빈한 밥그릇의 고요함이여
단순한 순명의 너그러움이여
탁배기 한잔에 어스름이 살을 풀고
목 메인 달빛이 문 앞에 드넓다
-고정희, ‘그대가 두 손으로 국수 사발을 들어 올릴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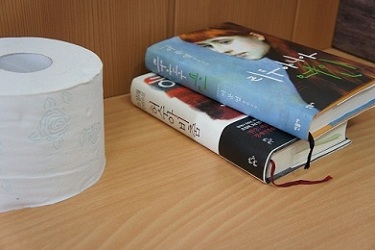
의자가 6개밖에 없는 허름한 밥집에 입 닦으라는 두루마리휴지와 함께 조정래와 이문열이...
아무래도 밥이 난 건 국수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밥에는 다른 것들을 제압하는 기운이 있어서인 듯.
‘밥!’ 할 때 처음 비읍은 입술을 다물게 했다가 모음과 함께 힘차게 입을 열리게 하고는
나중 비읍에는 話者의 입뿐만 아니고 듣는 이들의 입조차 “닫아(Shut up)!” 그러는 위엄이 서리더라.
오래 다물고 있지 못하니까 가쁜 숨 몰아쉬듯 할 때 “빠!”로 터지는 거지.
아빠~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Papa, le bon dieu까지 포함해서.
이 밥이라는 것도 누가 먹는 밥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왕은 ‘수라’, 양반이나 윗사람은 ‘진지’, 하인이나 종이 먹으면 ‘입시’, 귀신이 먹으면 ‘메’라고 하니
누구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언어의 대접도 다르구나.
‘진지’란 말에는 밥을 귀하고 공손하게 여기는 공경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 ‘진지’라는 말, 물론 우리말이니까 음을 빌려 한자로 옮기는 게 무리인 줄 알지만
참 眞 알 知를 대입할 수도 있겠고
잡을 지(摯)를 붙이면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함”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다.
海月神師 崔時亨 큰 어른은 “밥 한 그릇이 만고의 진리이다(食一碗 萬事知)"라고 그러셨고
또, “밥 한 그릇에 하늘과 땅과 사람, 곧 우주가 있다”(一碗之食 含天地人)는 말씀도 남기셨다.
예수께서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셨다. “나는 밥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밥은 있으면 진진한 기쁨, 없으면 간절한 소원, 그래도 안 나오면 절실한 아픔
그래도 안 생기면 죽음--그게 밥이다. 생명이란 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밥은 생명의 근원이다. 아니 생명 자체인 걸.
밥 보면 기쁨, 밥 얻으면 기운이 넘치고 밥 놓치면 눈앞이 가물가물, 다리가 후들후들
밥과 영영 인연 없게 되면 죽음!
그렇구나, 영락없는 밥이셨구나.

이철수 판화
‘저항’의 소극적 수단으로 사용되던 민중화가 이제는 ‘검색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화가 완성되어(?) 그런 게 필요 없는 세상 된 건지.
이런저런 공양{供養-참 좋은 말일세} 발원이 있겠으나 보통 이런 뜻인데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 하여
사부대중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나도 밥버러지나 식충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는데...
일단 낙원식당, 희망상회, 믿음부동산, 사랑여관... 그런 거리 순찰하려고.
하늘빛이 막걸리 같다할지, 꼬물거리는 파리 유충? 아님 백자? 암튼 그러네.
눈인지 살비듬 같은 게 흩뿌리는가 싶더니 그쳤나봐.



잠만 잘 분? “가자 장미여관으로”가 아니고, 밥은 안 주는 하숙이라는 뜻이려니.